“…….대체 뭐 볼게 있다고들 그러는지?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하는 건지…… 죽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죽으면 그만인 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끝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불행한 삶이더라도 살아만 있으면 바람도 쏘이고 정원도 거닐 수 있잖아요. 영혼이 빠지나간 육신은 더이상 인간이 아니라 흙덩이인 거예요. 영혼은 영이고 나머지는 흙, 흙일 뿐이니까. 어떤 사람은 요람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다 셀 때까지 살다가 죽기도 하지요. 행복한 사람들도 그렇고 사랑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죽고 싶어하질 않아요.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죠. 그런데 도대체 그 행복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p.112
<붉은 인간의 최후> 중에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Goun Seo'에 해당되는 글 1763건
- 2025.02.18 *
- 2025.02.17 우문현답 1
- 2024.11.21 [서울아트가이드 2024. 11월 호] 나혜석, 100년이 지나서야 닿은 공명 - 서고운 1
- 2024.11.21 더 룸 넥스트 도어 The room next door (2024) _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 2024.11.08 경찰관 속으로 _원도
# 이미지를 다루는 직업이라는 것. 개인전을 11회 치른, 이젠 43세나 먹어버린 나지만 여전히 작업은 너무 어렵다. 급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 어렵고, AI가 그려내는 그림들이나 쏟아지는 정보들 틈에서 나만의 것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거다. 정보는 많아졌지만 내용은 없는 시대. 지금의 나는, 내가 추구하는 작업들은, 과연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작업들일까(시대를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과연 진실된 나만의 의지인가(꼭 '진실된 나의 의지'가 필요한가). 나의 경험은 내가 어딘가에서 읽은 것, 본 것, 들은 것의 총집합일텐데 그 중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어야 하나(어쨋든 누구나 모든 경험은 뒤죽박죽이다. 무엇을 빼고 넣든 상관이 없다). 나의 창작이 과연 새로움일까(요즘 세상에 새롭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나. 재생산일 뿐이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믿는 나의 신념은 바뀌어야 하는걸까(바뀌지 않아도 된다).
10시간을 공들여 작업한 손그림들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널려있음에 가끔은 이런 어설픔, 흠이 있어보이는 그림들이 더 경이로울 수 있는거라고 나에게 말해줘야 할 것만 같다. 왜냐하면 그 가치들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존재하다는 걸 나를 통해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다.
"좋은 작업(이야기)은 오히려 빈집을, 울타리 없는 정원을, 바닷가의 인적없는 모래톱을 닮아야 한다. 관람자(독자)는 자신만의 무거운 짐과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한 소지품을, 의심의 씨앗과 이해의 가위를, 인간 본성의 경로가 그려진 지도와 굳건한 믿음이 든 바구니를 챙겨 그 장소에 들어선다. 그런 다음 작업(이야기) 속에 눌러 살며 구석구석 탐험하고, 가구를 자기 입맛에 맞게 다시 배치하고, 자기 내면 세계의 밑그림으로 온 벽을 뒤덮고, 이로써 작업(이야기)을 자신의 집으로 삼는다. 한 사람의 작가로서, 나는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모든 거주자를 만족시킬 집을 짓는 것은 힘에 부칠 뿐더러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보다는 차라리 나 자신이 현실과 언어로 지은 인공물 사이의 공감대에 위로 받으며 아늑하고 평온하다고 느끼는 집을 짓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켄리우 <은랑전 서문에서>
# 비비언 고닉은 '작가에게 무슨일이 일어났는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작가가 그 일을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나는 무슨 일이든 기억해내려고, 기억하고 싶어서,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하루 일과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떠올리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것이 전부였다면 지금의 나는 곧잘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는 배어나오고 침투하고 튀어나올 기회를 엿보는 전쟁터의 적군같다. 나는 내 삶의 전체를 아주 멀리서 보고싶다. 그래서 내 자신의 두려움과 비겁함과 기만을 다 이해해보고 싶다. 그렇게 나의 상황과 나를 거리두기 하고 싶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는 시험관은 정신을 번뜩 차렸더니 8차라고 한다. 고차수 난임 환자가 된 것이다. 나의 일상은 어느새 나와 작업 보다는 내 몸과 나의 가족이 더 중요해진 것 처럼 흘러간다. 당연히 우선순위를 따지려들면 일이나 작업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작업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해서 그게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은, 내가 엄마가 되고, 예성 예술가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주 설명하기 힘든 서사 같은 것이다. 왜 그것을 증명해야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야 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이 들지만 작업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아요!", "저는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경력단절 화가라는 수식을 달고 싶지 않아요!", "나의 자아를 확장하고 예술가로서의 자아까지도 확장하려면 SNS를 놓을 수 없어요!", "저는 잊혀지는 작가가 되고 싶지 않아요....."
'Tex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아트가이드 2024. 11월 호] 나혜석, 100년이 지나서야 닿은 공명 - 서고운 (1) | 2024.11.21 |
|---|---|
| 무용한 비극으로부터 (0) | 2024.10.22 |
| 맹렬하고 우울한 자유 (9) | 2024.09.02 |
| 100년이 지나서야 닿은 공명 _나혜석 답사기를 쓰면서. (0) | 2024.07.06 |
| 나의 아버지, 전각가 서용철. (3) | 2023.05.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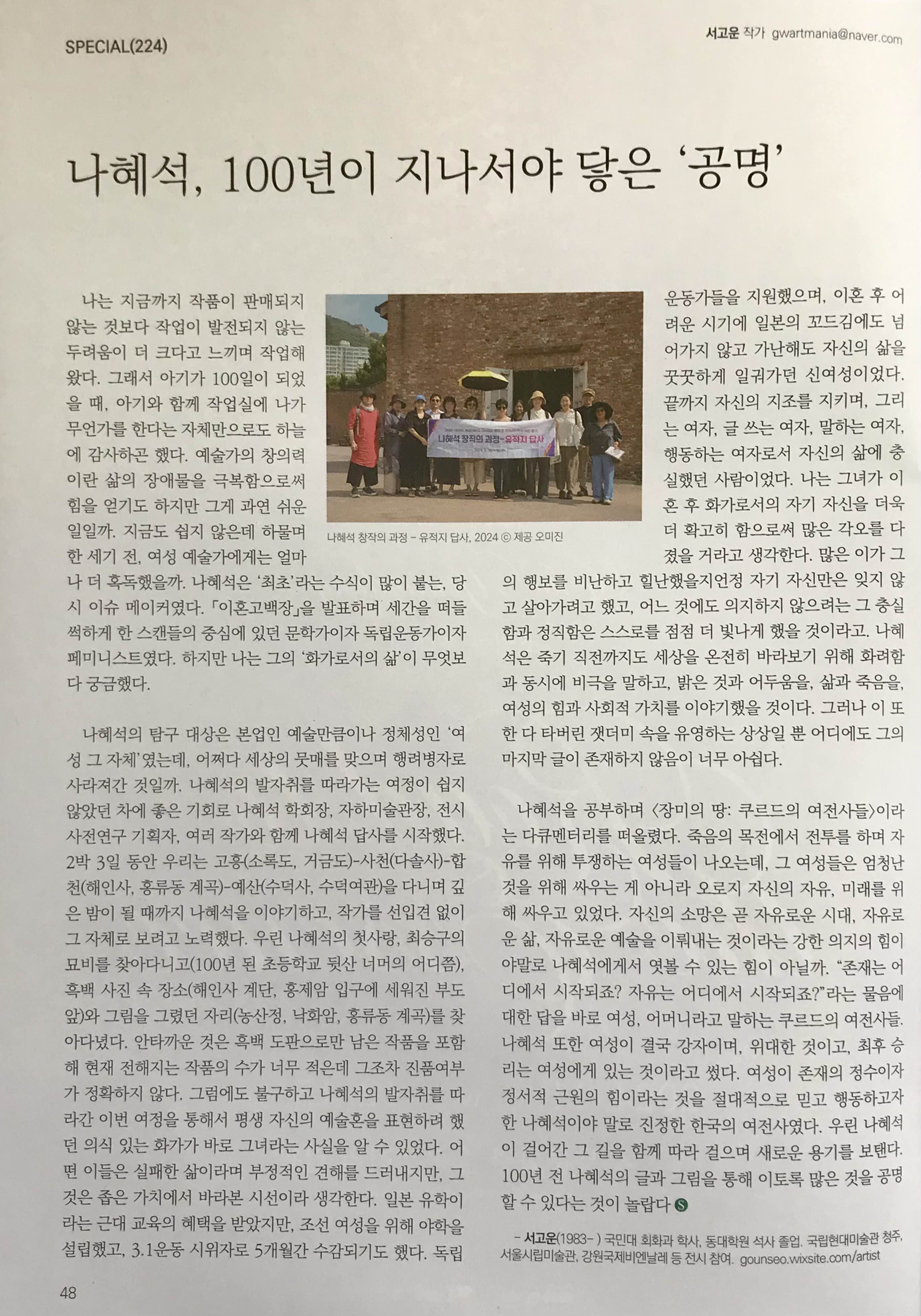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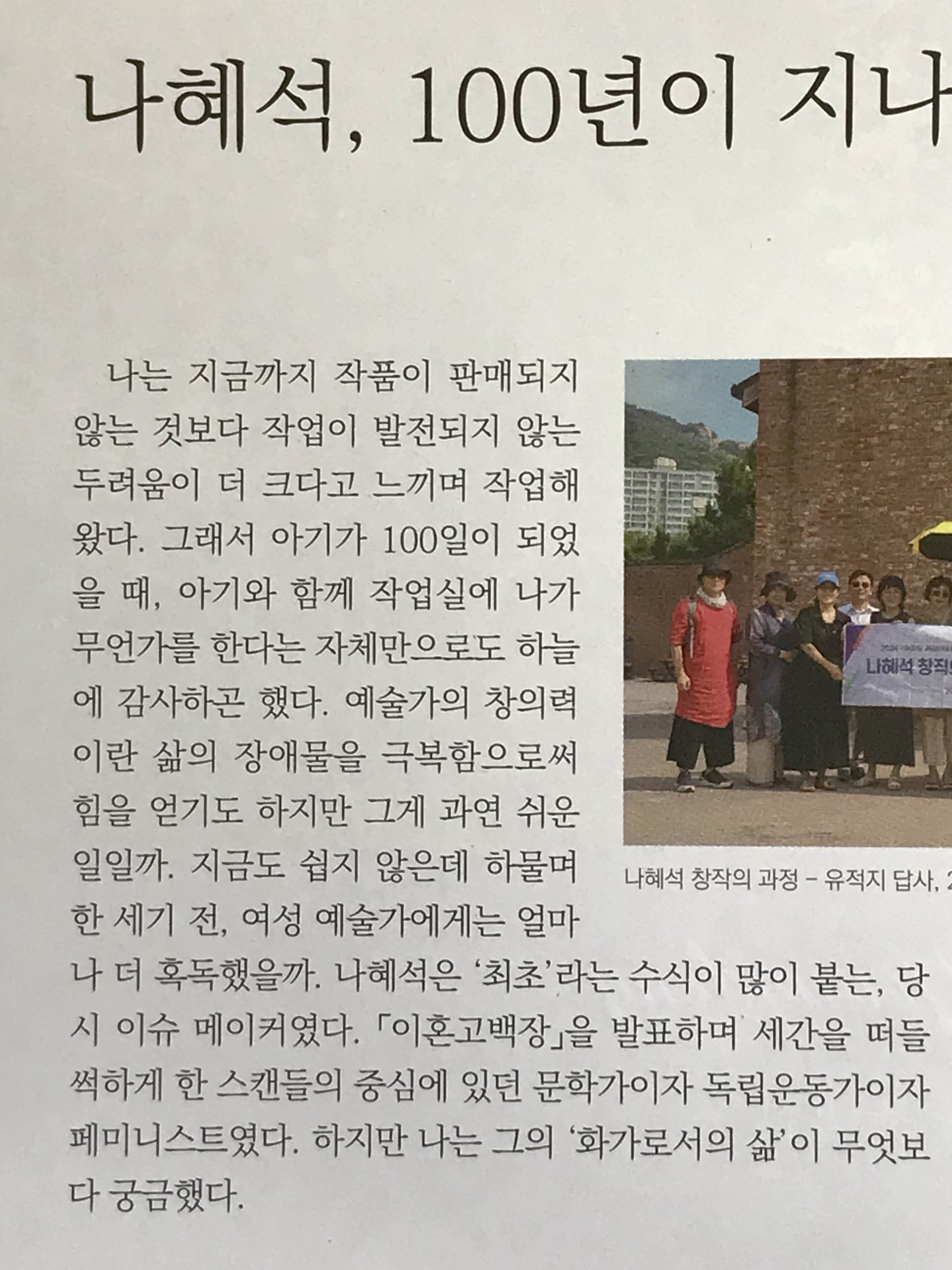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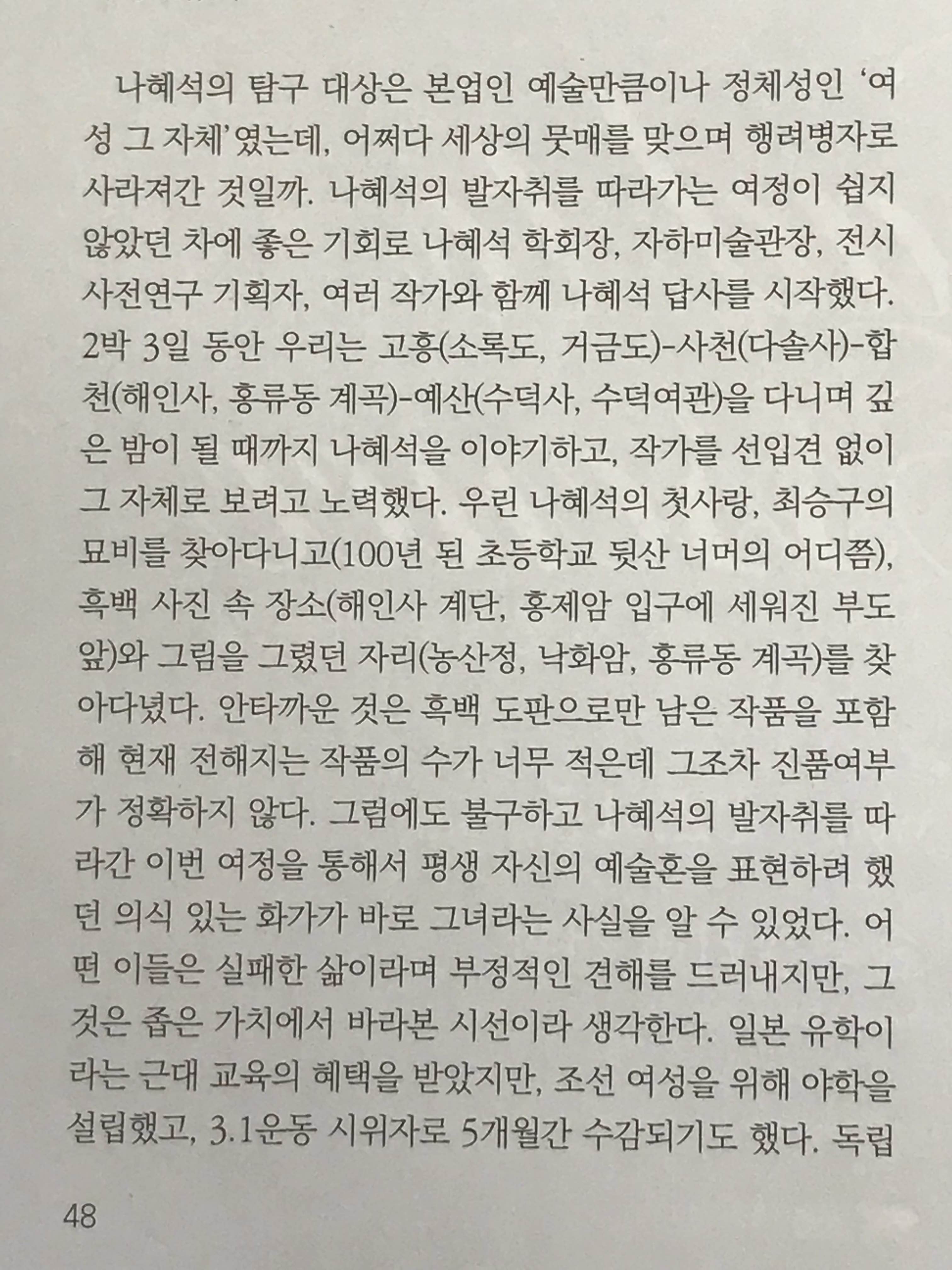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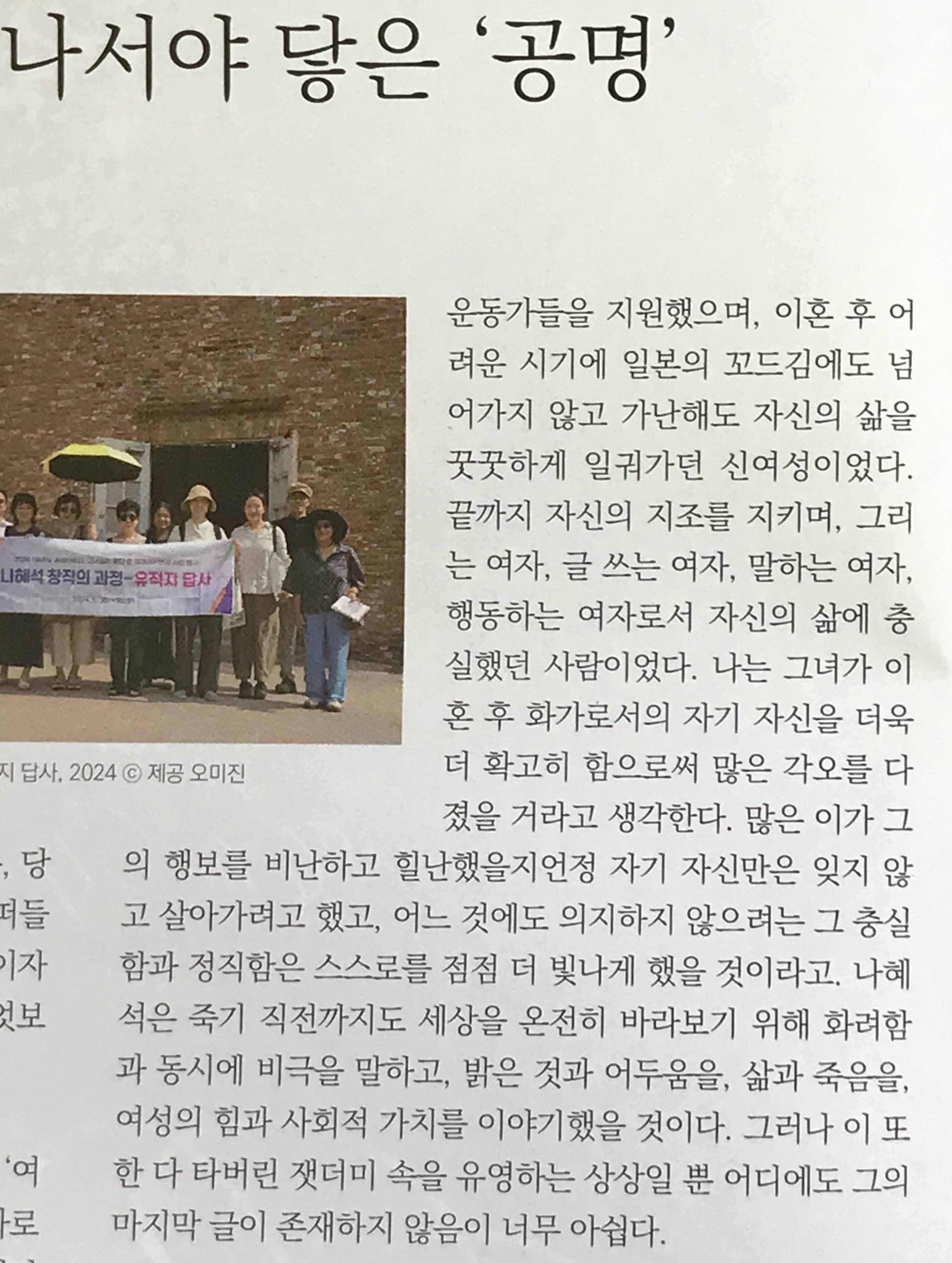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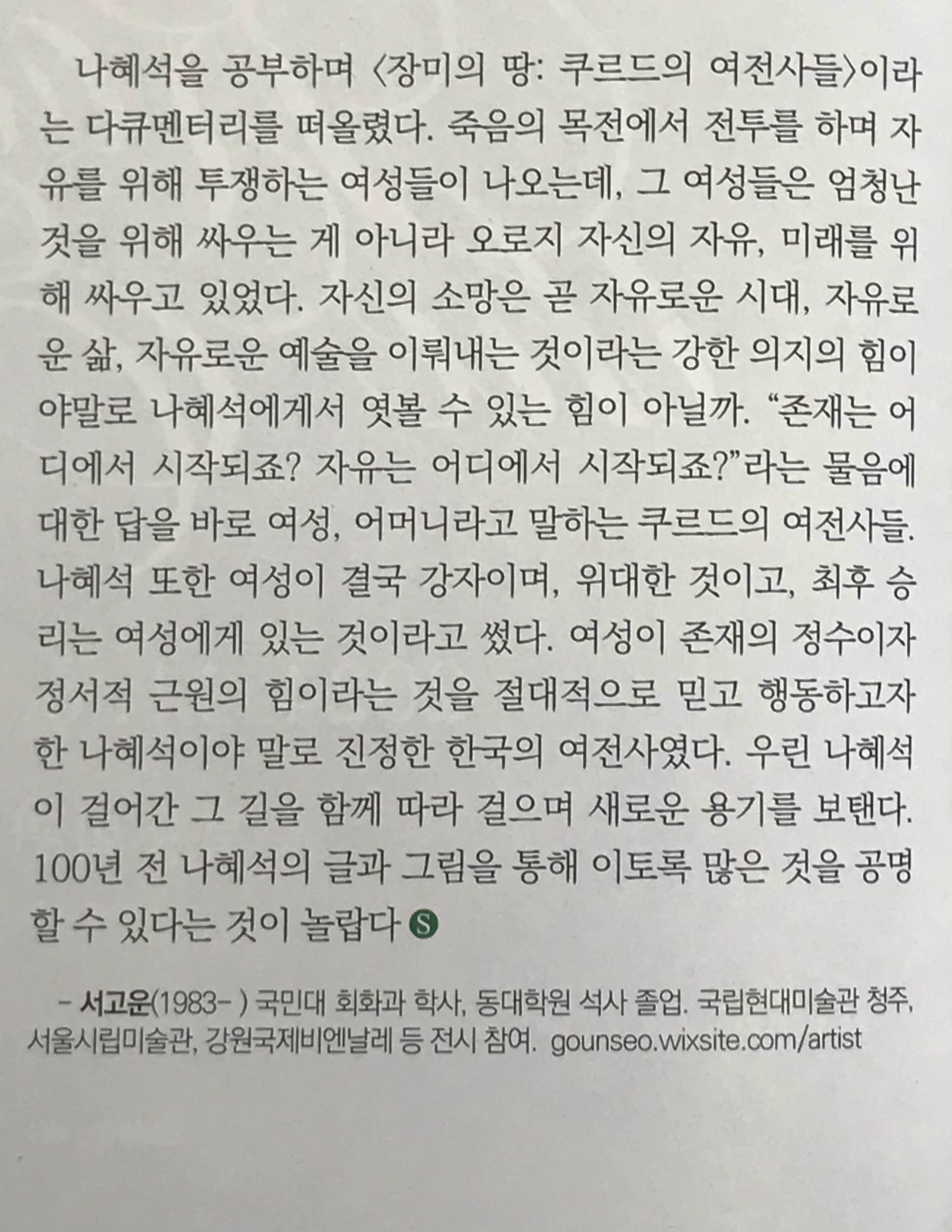
'Tex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문현답 (1) | 2025.02.17 |
|---|---|
| 무용한 비극으로부터 (0) | 2024.10.22 |
| 맹렬하고 우울한 자유 (9) | 2024.09.02 |
| 100년이 지나서야 닿은 공명 _나혜석 답사기를 쓰면서. (0) | 2024.07.06 |
| 나의 아버지, 전각가 서용철. (3) | 2023.05.26 |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첫 영어 장편 영화인 <더 룸 넥스트 도어>를 봤다.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영화를 내 최애 영화라고 말하고 싶다. 영화가 끝나고 한참을 죽음에 대한 명상을 했던 것 같다. 자신의 죽음을, 아니면 가까운 타인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 그리고 관계들, 시간들 사이의 여러가지 감정들... 죽음에 대한 세심한 대화들과 위로와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너무 따뜻하면서도 비극적인 감정이 계속 교차되었는데, 그건 이 둘의 연기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인 것 같다. 영화 속 아름다운 컬러들에 매료된 상태로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준 영화. 나는 이 영화를 사랑할 수 밖에 없다.
'Movi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작새 (2024) _변성빈 감독 (3) | 2024.10.28 |
|---|---|
|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0) | 2021.05.23 |
| 제삼자_인도 옴니버스 영화 4편, 2021 (0) | 2021.04.26 |
| Bombay Begums, 2021 (0) | 2021.03.23 |
| 택시더미아 Taxidermia (2006) (0) | 2021.03.01 |

그 순간 내 삶은 생과 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삶과 죽음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큰 바다를 향해 작은 강물들이 모이는 듯 해. 그리고 나는 망망대해에 돛단배 하나 타고 하릴없이 흐느적거리는 존재처럼 느껴져. 살아간다는 건, 죽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나는 삶과 죽음이 한 단어로 불리는 것을 들으며, 이제 막 백일을 넘긴 내 조카를 보며, 오늘도 생의 의미를 반추하며 길을 나서. 엄마 손을 잡고 소아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유아를 보고, 반세기 전에는 엄마 손을 잡았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바싹 마른 나무처럼 늙어버린 손으로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을 봐.
결국 인생이란 것도 그런게 아닐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 그게 돈이든 나의 인연이든, 심지어 내가 차곡차곡 쌓아온 기억이든. 세월이 흐르면서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듯 서서히 하나 둘씩 바람을 타고 사라져가고 나중에 홀로 남은 나 자신만이 눈을 감게 되는 것.
적지 못한 감정, 담지 못한 마음, 쓰지 못한 기억, 하지 못한 노래. 그리고 잊지 못한 사람에 관한 모든 기억을 하나씩 잃어간다는 건 어떤 비극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부질없이 느껴지는데, 나는 뭐가 아쉬워서 모든 것을 꽉 붙잡기 위해 아등바등 현재을 보내는 걸까.
'book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의학자의 서재 _나주영 (1) | 2024.11.06 |
|---|---|
| 맡겨진 소녀 _클레어 키건 (0) | 2024.09.11 |
|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 _정보라 연작소설 (0) | 2024.06.19 |
| 방 안의 호랑이_박문영 (추가 예정) (1) | 2024.06.19 |
| 비키 바움 <크리스마스 잉어> (0) | 2024.05.29 |
